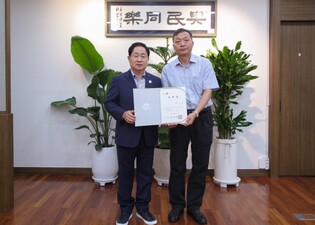한국 사회는 더 이상 이주노동자 없이 돌아가지 않는다. 저출산과 고령화,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속에서 이주노동자는 이미 산업 현장의 필수 구성원이 됐고, 상당수는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문제는 정책의 시선이다. 우리는 여전히 이주노동자를 ‘일하는 사람’으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현행 이주노동자 정책의 중심에는 고용허가제, 체류자격 관리, 근로조건 보호가 있다.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그 노동자의 하루가 끝난 뒤,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와 자녀의 삶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돌봄은 누가 책임지는지, 아이는 학교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아플 때 병원 문턱은 넘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늘 뒤로 밀려왔다.
이주노동자 가족은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불안정한 노동환경, 체류 지위에 대한 불안,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동시에 작용한다. 이 취약성은 개인에서 끝나지 않고 가족 전체로 확산된다. 그럼에도 정책은 여전히 분절적이다. 교육은 교육대로, 복지는 복지대로, 출입국 행정은 행정대로 따로 움직인다. 위기 상황이 닥치면 가족은 여러 기관을 전전하며 도움을 구해야 한다. 이것이 과연 지속가능한 사회의 모습일까.
특히 우려되는 지점은 이주노동자 자녀 문제다. 언어 지연, 학교 부적응, 차별 경험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미래 사회의 비용으로 되돌아온다. 그럼에도 우리는 “체류 자격이 불안정하다”, “제도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아이들의 권리를 제한해 왔다. 국적과 신분 이전에, 아이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기본 원칙조차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이제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이주노동자를 ‘개인 노동자’가 아닌 ‘가족을 가진 생활인’으로 바라보는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가족 단위로 욕구를 진단하고, 상담·교육·돌봄·의료·주거를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이는 복지의 확장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예방 정책이다.
또한 접근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권리 기반 접근이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은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는 체류 지위와 무관하게 교육과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사회통합의 출발점이다.
이주노동자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는 ‘도와주는 정책’이 아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정책이다. 이들을 배제한 채 지속가능한 사회를 말할 수는 없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얼마나 통제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로.
이주노동자 가족을 바라보는 정책의 시선이 바뀔 때, 한국 사회의 미래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터넷신문 = 우경원 선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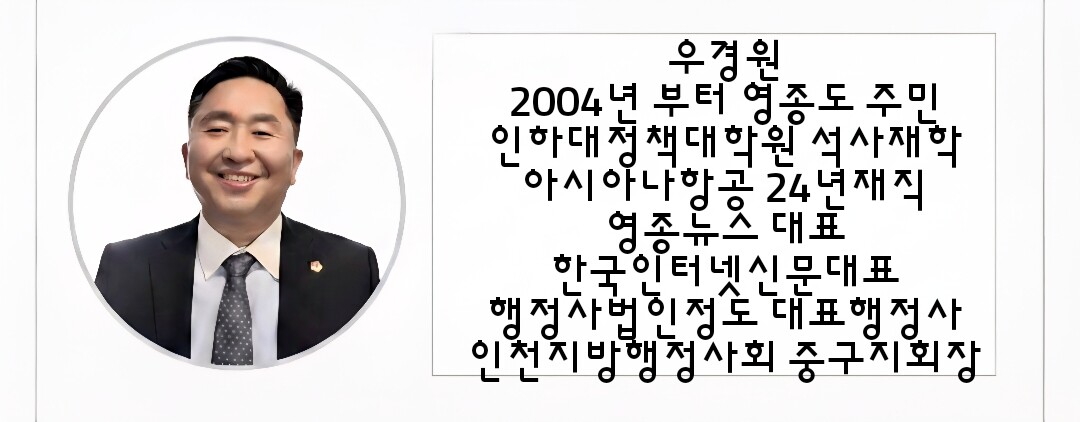
[저작권자ⓒ 한국인터넷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